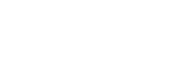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내 기사가 독자들에게 많이 읽히지 않았으면 했다. 작게는 내 기사가 매체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가 된 적도 있었고. 크게는 포털사이트 메인에도 올라가곤 했지만, 사실 그게 싫었다.
많은 기자들은 자기가 쓴 기사가 많이 읽히는 걸 좋아한다. PV가 수익으로 연결되고, PV 높은 기자가 능력자로 평가받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세상에 이 만큼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즐기는 기자들도 적지 않다. 어떤 분들이 보기엔 꼴값 떠는 ‘관종’이겠지만, 기자로서 내가 갖지 못한 부러운 자질이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싫었다. 특히 논쟁적이고 정파적 성격이 짙은 기사를 쓸 때 더 그랬다. 하나의 기사를 쓰면 적게는 수백명이, 많게는 수백만이 볼 때도 있었다. 그런 기사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적으면 한두명 뿐이었고, 많이 달아도 수천여명에 불과했다. 기사를 보는 사람의 수천분의 일만이 댓글을 달아 그들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지만, 고작 그 정도의 댓글에 분하고 상처받아 밤새 뒤척인 적도 있다.
지금 ‘문빠’들이 댓글로 정치를 망친다고 단언하는 일부 진보적인 사람들도 내가 진보정치를 전문으로 하는 매체에 근무했을 때 나에게 종종 악플을 달곤 했다. 비판 보다는 비아냥을, 조롱을, 심지어 기사에 담긴 수많은 글자 중 단 한 글자도 친 적 없는 내 부모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다. ‘A라는 현상이 내가 분석했을 때는 B임이 분명한데, 너는 왜 C를 얘기하냐’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는 오보고, 이 기사를 쓴 나는 자격도 없는 기레기로 취급받을 뿐이었다. 그들은 취재도 안 하고 기사를 썼다며 나를 조롱해댔고, 정파적이라며 비판했다. 취재를 안 하고 썼을 리가 있나. 문제는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나를 서로 상대 쪽이라며 비난해댔다는 데 있다.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지난 2019년 12월, 한겨레 기고를 통해 “‘해장국 언론’을 원하는 국민이 많은 상황에선 언론 개혁이 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강준만 교수의 이 말 이후, 이 ‘해장국 저널리즘’이란 생소한 단어는 ‘특정 정치세력 지지자’들의 언론 소비 행태를 비판하는 가장 적확한 말로 대변되고 있다.
얼마 전 뉴스톱 김준일 대표도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현재 뉴스 소비자는 원하는 것만 듣는다. 나아가 그런 방식을 언론에 요구한다. 정파적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는 이유다. 언론 불신이 높은 이유에 언론 책임이 크다. 그러나 언론 탓만 있을까? 해장국 언론만 찾는 독자와 국민 탓은 없는가? 언론 잘못이 30%라면 마찬가지로 30%는 독자 탓이다.”
물론 김준일 대표 인터뷰의 핵심이 이 얘기는 아니었지만, ‘해장국 저널리즘’이란 단어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뉴스 소비자들’이라니. 정말 이 현상이 문재인 정부 지지자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나?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현상이 이 정부 들어와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것인가? 그게 그렇지 않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내가 댓글 때문에 고통받던 시점은 2010년 이전이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면서도 악플에 시달렸던 것은 똑같았다. 정파적이지 않다고 여겼던, 어려운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다뤄도 악플이 달렸고 비난이 이어졌다. 촛불 정국 때는 일하던 매체에 어떤 어르신들이 전화를 걸어 마구잡이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대체 그때와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당장 ‘해장국 저널리즘’이란 개념을 만들어 낸 강준만 전북대 교수는 안티조선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다. 물론 강준만의 안티조선운동이 이후 전개된 안티조선운동과 같다고 보긴 어려웠지만, 조선일보의 오만한 색깔론을 거부하고 언론을 비평적으로 소비했다는 점에서 강준만 교수의 당시 관점은 ‘해장국 저널리즘’과 맞닿아 있다.
거칠게 말해, 기자들 입장에서는 원래 그랬다. 사람들은 “잘 봤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하려고 댓글을 달지 않는다. 댓글은 원래 대부분이 비판이고 욕이다. 기자를 향한 것이든, 기사에 나온 누군가를 향한 것이든 대체로 속성이 그렇다. 그리고 언론에 대한 비판적 시선은 그 어떤 기사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겐 존재해 왔다. 단순히 기자라는 직업인이 썼다고 해서 기사가 만고불변의 가치를 지니고,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평가되리라 생각하는 건 우스운 일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진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바탕으로 기사를 신뢰하기도 하고, 신뢰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비평을 하고 비평을 하지 않기도 한다.
10년 전의 내가 그랬든, 10년 전, 5년 전 그 어떤 기자도 자기 기사에 기분 나쁜 댓글이 달린다고 독자들이 해장국이나 찾고 있다거나 맹목적인 ‘빠’라 부르지 않았다. MBC PD 수첩은 실력 행사까지 나선 황우석 지지자들과 매일 같이 전쟁을 벌이면서도 황우석의 실체를 드러내는데 노력했지, 방송에서 그의 지지자들을 비판하거나 조롱하지 않았다. 특정 교회 교인들이 방송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현수막을 걸고 소리를 질러대도 저널리스트들이 주목한 것은 팩트지, 그 교회 교인들이 아니다.
하물며, 기자가 쓴 기사의 팩트가 사실과 다르다고 정치적 견해가 나와 같지 않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을 지식인들과 언론인들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의식하고 비난해대는 것인가? 갑자기 왜 언론 수용자의 언론 소비 행태를 한국 언론 개혁의 장애물로 지목하고 한국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원흉으로 꼽는가.
대부분의 언론이 출입처 중심으로 기사를 내면서, 또 포털 위주의 한 입 거리 기사만 쏟아지면서 한국 언론 소비자들은 다양한 뉴스 소비 기회를 상실했다. PV저널리즘에 상실된 인간성을 목도한 적도 많았고, 선정성에 뜨악한 일도 많았다. 언론이 소비자 위장에 독한 술을 부어놓고 해장국을 찾는다고 비난해대고 있으니, 소비자입장에선 황당한 일이다.
언론은 정파적이어선 안 된다는 거짓말을 해대며 소비자도 정파적이어선 안 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해본들, 먹혀들 리가 없다. 독자들은, 소비자들은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기사를 보면 화도 내고 나쁜 평가도 내리고 비판도 하는 거다. 전화로 항의하는 것도 그냥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는 것이고, 구독을 끊고 후원을 중단하는 것도 하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솔직함이 필요하다. 결국 ‘해장국 저널리즘’이라는 말로 하고 싶은 말은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구독료를 내고 후원금을 내고, 좋은 언론을 응원해야 한다는 것 아닌가. 기사 방향이 나와 맞지 않는다고 구독을 끊고 후원금을 끊는 것이 싫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 떠나는 독자를 잡겠다고 내 생각과 다른 기사를 쓸 수는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결국 선택의 문제다. 독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독자를 찾아 나서든지 변화의 주체는 언론사지, 독자들에게 해장국 좀 그만 먹으라고 다그쳐봐야 달라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지금 독자들에게 외면받더라도, 그 고집이 재평가를 받으면, 다시 떠나간 독자들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다행인 것은 강준만 교수가 독자들과의 소통 방식을 넓힐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지면을 열고, 언론은 공론의 장으로 역할을 해보자는 제안은 해장국 운운하는 것보다 훨씬 세련돼 보인다.
물론 기자를 협박한다든지, 공개되지 않은 기자의 신상정보를 특정 커뮤니티에 공개한다든지, 성희롱 발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관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행위는 범죄일 뿐이고, 범죄는 범죄의 수준에서 대응해야 한다. 하지만, 해장국을 찾는 것이 범죄는 아니다.
핑계 대지 말자. 언론 개혁을 막고 있는 것은 늘 존재했던 댓글이 아니라,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언론 자신이다. 설령 태극기 집회 참석자라고 할지라도, 독자를 욕하는 건 참 꼴사나워 보인다.